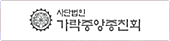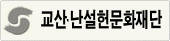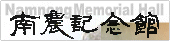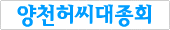|
|
||
| ㆍ작성일 : 2011-01-19 (수) | ㆍ조회 : 3403 | |
|
[역사속의 강원인물] 낚시 즐겼던 사천 앞바다서 교산이 된다, 용이 못 된 이무기처럼 강원일보 / 2011-1-14 교산(蛟山) 허균을 만나러 가는 길 - 강릉 사천진리 생가터 `애일당'
시대의 이단아. 자유와 파격을 사랑했던 사상가. 시대를 풍미했던 한 개혁가를 우리는 이렇게 수식한다. 천재 문학가이자 높은 이상세계 실현을 꿈꿨던 교산(蛟山) 허균. 고고한 기상으로 빛났던 그의 흔적을 더듬어봤다. 꾸불꾸불한 능선이 이무기 같다고 지어진 길 이름 본떠 '호'를 지어 해안가 교문암에 이무기가 떠나면서 바위 두 동강 냈다는 전설도 내려와 100㎡ 규모 초미니 홍길동전박물관 500여년전 쓴 소설의 흔적 '고스란히' ■애일당(愛日堂) 허균의 고향은 강릉 사천진리다. 시내에서 7번국도를 따라 주문진 방향으로 10여분을 달리다 보면 허균이 태어난 애일당이 나온다. 허균의 생가터로 알려진 초당동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은 누이인 허난설헌의 출생지다. 애일당은 허균의 외조부인 예조판서 강릉김씨 김광철의 집이다. 당시 동인의 우두머리로 활약했던 초당 허엽이 김광철의 딸을 두번째 부인으로 맞으면서 허균은 강릉과 인연을 맺었다. 누이인 허난설헌 역시 김씨 부인과 낳은 딸로 허균과는 각별한 우애를 나눴다. 애일당은 허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곳에서 허균의 호탕하고 대범한 자유로운 성품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허균은 어릴때부터 작은 어촌마을을 오가며 학문을 갈고닦았다. 5살 때부터 읽었고 9살 때는 이미 시 짓는 즐거움을 터득했다. `교산(蛟山)'이라는 호 역시 애일당에서 나왔다. 어린 허균은 외가에 올 때마다 외사촌들과 사천 앞바다에 나가 바다낚시를 즐겨했다. 애일당 뒤편으로 이어진 가파른 능선에서부터 사천진리 앞바다를 이어주는 길의 이름이 바로 교산이었다. 꾸불꾸불한 능선이 마치 이무기 같다고 해 지어진 이름이다. 과거에 급제한 이후 성년이 된 허균은 자신의 호를 교산이라 지었다. 운명을 예견한 걸까. 허균은 늘 꿈꿨던 이상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호처럼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평론가들은 “허균이 바다낚시를 즐겼던 사천 앞바다의 교문암에도 이무기가 떠나면서 바위를 두 동강 냈다는 전설이 있다”며 “뛰어난 학문과 사상은 용처럼 승천하지 못하고 그의 호처럼 이무기로 남았다”고 전한다. 현재 사천진리에는 애일당 터만 남아 있으며 애일당 입구에 전국시가건립동호회가 세운 `교산시비'가 서 있다.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허균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허균·허난설헌 기념관이다. 초당동의 허난설헌 생가터 인근에 2007년 설립됐다. 이곳에는 허균 사상과 문학작품을 소개한 영상자료는 물론 국조시산, 하곡조천기 등 그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홍길동 영인본의 목판 탁본 체험장, 허씨 5문장을 소개한 전시패널 등도 전시돼 허균은 물론 허난설헌 등의 작품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인근에는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이 있다. 누이인 허난설헌의 생가터를 중심으로 울창한 송림과 고풍스런 한옥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사랑채와 안채, 곳간채가 `ㅁ'자로 들어서 허씨 일가의 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허균이 꿈꾼 세계, 홍길동전박물관 허균은 명문 사대부가에서 태어났지만 파격과 자유로움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대범한 생활을 즐겼다. 유교적 관념에서 벗어나 불교를 숭상하기도 했고, 때로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을 벌여 관직에서 파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가 개혁적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이상' 때문이었다. 그 이상세계를 담은 작품이 바로 `홍길동전'이다. 최초의 한글소설이기도 한 `홍길동전'에는 허균의 사상과 사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500여년 전 그가 쓴 `홍길동전'의 흔적은 바로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입구에 들어선 홍길동전 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다. 100㎡ 규모의 초미니 박물관으로 이곳의 명예관장인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가 그동안 수집한 다양한 홍길동전 관련 물품이 전시돼 있다. 홍길동전 고소설 판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출간된 홍길동전 번역본, 만화, 드라마 대본, 영상물 등 20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 전시실 바로 옆에는 공방도 함께 운영돼 홍길동전을 주제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2008년 개관해 어린이는 물론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홍길동전'에서 허균은 크게 `유재론'과 `호민론'을 주장했다. 서얼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을 내세워 시대의 비극을 묘사했다. 집을 나와 의적으로 활약하며 백성의 편에 서는 홍길동의 모습에서도 백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사상을 찾을 수 있다.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성소부부고' 의 `호민론'에도 여과없이 드러난다. “항상 눈앞의 일들에 얽매이고, 그냥 따라서 법이나 지키면서 윗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이란 항민(恒民)이다. 항민이란 두렵지 않다. … (중략) … 한없는 요구에 제공하느라 시름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윗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이란 원민(怨民)이다. 원민도 결코 두렵지 않다. 자취를 푸줏간 속에 숨기고 몰래 딴 마음을 품고서, 천지간(天地間)을 흘겨보다가 혹시 시대적인 변고라도 있다면 자기의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란 호민(豪民)이다. 대저 호민이란 몹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다.” (호민론) 그가 꿈꿨던 이상세계의 결정체는 바로 `율도국'이었다. 소설 속에서 홍길동은 활빈당을 이끌고 `율도국'을 건설한다. 봉건사회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지만 사회의 모순에서 탈피한 평화의 세계였다. 허균의 `율도국'은 고전소설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유토피아였다. 최초의 한글소설이라는 국문학적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홍길동전'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으로 꼽힌다. 허구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당대 위대한 개혁가의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소설 속 `홍길동'은 허균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큰 꿈을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홍길동과 허균은 꼭 닮아 있다. 하지만 모순과 부조리가 판쳤던 현실은 비극이었다. 홍길동이 율도국을 건설해 꿈을 이룬 것과 달리 허균은 아스라이 사라졌다. 승천하지 못한 허균의 꿈은, 그래서 더 아련하게 남아 있다. 강릉=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