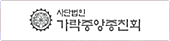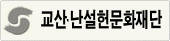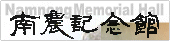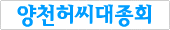국역 고려사 : 열전 허공[ 許珙 ]
허공(許珙)은 자가 온독(韞匵)이고 처음 이름이 허의(許儀)이며 공암현(孔巖縣 :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사람으로, 부친 허수(許遂)는 관직이 추밀부사(樞密副使)에 이르렀다. 허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모가 빼어났다. 고종 말에 과거에 급제하자 승선(丞宣) 유경이 허공과 최녕(崔寧)·원공식(元公植)을 천거하여 나란히 내시(內侍)에 소속시키고 정사점필원(政事點筆員)으로 삼자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정방삼걸(政房三傑)이라고 불렀다. 국학박사(國學博士)로 옮겼고 원종 초에는 합문지후(閤門祗候)로 임명되었으며, 거듭 승진해 호부시랑(戶部侍郞)을 지내면서 『신종실록(神宗實錄)』·『희종실록(熙宗實錄)』·『강종실록(康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원종 10년(1269)에 우부승선(右副承宣)·이부시랑(吏部侍郞)·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임명되었다.
당시 임연(林衍)이 정권을 잡고 제멋대로 위세를 부리면서 아들 임유무(林惟茂)를 허공의 딸에게 장가들이려 했으나 허공이 허락하지 않았다. 임연이 협박을 해도 끝내 거절하자 임연은 결국 왕에게 알렸고, 왕은 허공을 불러,
“임연은 성격이 간악하니 원한을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은 깊이 생각하라.”
고 설득했다. 그러나 허공은,
“제가 차라리 화를 당할지언정 딸을 역적의 집으로 시집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니 왕이 그를 의롭게 여기고
“경은 잘 대처하라.”
고 당부했다. 허공이 물러 나와 바로 딸을 평장사 김전(金佺)의 아들 김변(金賆)에게 시집보내니 임연이 그 일을 두고 큰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 후 임연이 김준(金俊)을 죽일 때 많은 문신과 무신들도 해를 입었다. 허공이 마침 처의 장례를 치르고 양천현(陽川縣 :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통진현(通津縣 :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에 이르러 변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자신도 해를 입을까 우려한 나머지 강에 투신해 자살하려고 했다가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라 마음을 다잡고 개경으로 들어갔다. 임연이 많은 조정의 신하들을 죽이고 나니 함께 관리의 선발을 의논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지라 측근들에게 허공이 귀경했는지를 물었다. 허공이 그 말을 듣고 임연의 집으로 갔더니 임연이 크게 기뻐하며 맞아들여 자리를 권한 후, 일이 있어 장례에 가지 못했으니 나무라지 말기를 바란다며 사과하고 그에게 관리의 선발을 맡겼다. 허공이 적절하게 관리를 선발하고 임명했으므로 임연이 기뻐하며 왕에게 보고해 후하게 선물을 내려주게 했다.
임연이 왕을 폐위시킨 후 병 때문에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거짓말로 몽고에 표문을 보냈다. 몽고에서는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왕이 직접 입조해 진상을 말하라고 재촉했다. 왕이 원나라로 가는 길에 송참(松站)에 이르자 호종하는 신료(臣僚)들에게,
“동경행성(東京行省)에서 임연이 마음대로 왕을 폐립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가?”
라고 의논하자 허공과 대장군(大將軍) 이분희(李汾禧), 장군(將軍) 강윤소(康允紹) 등이 임연의 뜻에 따라, 표문에 적힌 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시 유초(庾超)란 자는 승선(承宣) 유홍(庾弘)의 아들로 승려가 되었다가 환속해 이장용(李藏用)의 손녀에게 장가들었다. 이장용을 따라 원나라에 갔다가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고려의 승선(丞宣) 허공, 상장군 강윤소, 장군 공유(孔愉)가 공모해 원나라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무고했다. 황제가 부카[不花]를 시켜 허공 등을 체포해 유초와 대질 심문시켰더니 유초가 거짓말이라고 자복하므로 그를 장형에 처했다. 뒤에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로 승진했다가, 충렬왕 원년(1275) 개정된 관제에 따라 감찰제헌(監察提憲)으로 임명되었다.
허공은 정당문학 윤극민(尹克敏)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처가 죽은 후 자기 집에서 길렀던 처제의 딸과 재혼하고서 헌사의 탄핵을 받았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새로운 관직 제도에 따라 직함이 바뀌자 왕에게 사례했으나 허공만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뒤에 판밀직(判密直)·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를 역임하였다. 원나라 세조가 일본을 정벌하려 하자 왕은 도지휘사(都指揮使)를 각지로 보내어 전함의 건조를 독려했다. 허공은 경상도로 가고 홍자번(洪子藩)은 전라도로 갔는데, 홍자번이 반도 못 마쳤을 때 허공은 벌써 일을 완료하고 돌아오니 홍자번이 그의 능력에 탄복하였다. 참문학사(參文學事)·수국사(修國史)로 옮겨 한강(韓康)·원부(元傅) 등과 함께 『고금록(古今錄)』을 편찬하였고 이에 첨의중찬(僉議中贊)으로 임명되었다.
16년(1290), 충렬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허공은 홍자번과 함께 개경에 남아 지키고 있었다. 카다안[哈丹]이 지휘하는 적병이 동쪽 변방으로 침입하려 했는데, 적이 이미 우리땅 깊이 들어왔다는 유언비어가 떠돌아 전국의 인심이 흉흉해졌다. 홍자번 등이 강화(江華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로 피난하자고 주장하자 허공과 최유엄(崔有渰)만은,
“지금 주상께서 원나라 수도에 계신데 어찌 유언비어를 믿고 마음대로 도읍을 옮기겠는가?”
라고 반대했다. 홍자번 등이 원로 재상들을 모아 놓고 의논한 후 다들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니 허공이 어쩔 수 없어 당리(堂吏) 문증(文証)에게,
“중론이 이러하니 막을 도리가 없다. 나와 그대가 수도를 지키며 왕명을 기다리자.”
고 했다. 이에 재상들이 모두 나서,
“사람들이 허중찬(許中贊)이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했는데 어찌 지금은 나라를 그르치는가?”
하고 비난했다. 허공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손들을 불러 놓고,
“나는 반드시 여기에 머물 터이니 너희들 가운데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자손이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으로 처단할 것이다.”
고 선포했다. 얼마 뒤에 인후(印侯)가 원나라로부터 와서,
“황제가 다시 강화도로 천도한다는 말을 듣자 왕에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주모자를 잡아 오라.’고 분부했다.”
고 알리자 그제야 나라 사람들이 허공의 지혜와 식견에 탄복하였다. 이듬해 원나라가 군사를 보내 카다안 토벌에 나서자 허공도 군사를 동원해 협조했다. 며칠을 계속 말을 탔으므로 감기에 걸렸으나 여러 달 동안 버티다가 8월에 병이 위독해져서 쉰아홉 살로 죽으니 시호를 문경(文敬)이라 했다. 왕은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김현(金儇)을 시켜 제문을 짓게 하였다.
허공은 성품이 겸손하고 검소했으며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다. 고관이 되어서도 한 그릇 식사에 베 이불과 부들 요를 깔고 지내면서 늘 즐거운 기색을 잃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말을 삼갔고 한가히 지낼 때라도 기대어 앉지 않았으며 마치 귀한 손님을 만난 것처럼 행동을 조심했다. 젊었을 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늘 종 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버려진 사람의 뼈와 썩은 살을 묻고 장사지내 주었으며 버려진 시체를 보면 몸소 져다가 묻어주었다. 한번은 달밤에 거문고를 타고 있었는데 이웃의 처녀가 담을 넘어 달려왔으나 허공이 가까이 하지 않고 예의로 타일렀더니 처녀가 부끄러워하며 뉘우치고 돌아갔다.
충선왕 2년(1310)에 충렬왕의 묘(廟)에 배향하였다. 아들은 허정(許程)·허평(許評)·허관(許冠)·허총(許寵)·허부(許富)이다. 허정은 동주사(東州事)를 지냈다. 허평은 뒤에 이름을 허숭(許嵩)으로 고쳤으며 검교정승(檢校政丞) 양천군(陽川君)까지 지내다 죽으니 시호를 양숙(良肅)이라고 하였고 아들로 허종(許悰)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