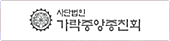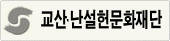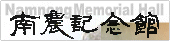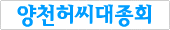|
|
|
||
| ㆍ분류 : 조선 | ||
| ㆍ별칭/관직명 : 좌찬성 | ||
| ㆍ세수(世數) : 19 | ||
| ㆍ봉군(封君) : 양천군 | ||
| ㆍ공신(功臣) : 위사1등 | ||
| ㆍ호당(湖堂) : 성세창 | ||
| ㆍ문장/서화 : | ||
|
위사공신 1등 / 봉군은 양천군 / 호당(성세창 선) / 문장가 (동애유고; 東厓遺稿) 자는 남중(南중)이고 호는 동애(東厓)이다. 조부는 합천군수(陜川郡守)를 지낸 훈(薰)이고 아버지는 의영고령(義盈庫令)을 지낸 원(瑗)이며 어머니는 선산김씨(善山金氏)이며 배위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증손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와 광산김씨(光山金氏) 두분이다. 공은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총명하여 어렸을때부터 학업을 성취하여 1516년(중종11)에 생원(生員)이 되고 신설된 현량과에 뽑혔으나 나가지 않았다. 1523년(중종18)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저작(著作),박사(博士), 수찬(修撰)을 두루 역임한 후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1534년(중종29)에 이조정랑(吏曹正郞)이 되었으며 김안로(金安老)가 집권하자 양근군수(陽根郡守)로 좌천되고 뒤에 통정대부로 승급하여 황주목사(黃州牧使)로 나갔다. 1537년(중종32) 김안로가 실각하자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병조참의(兵曹參議),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올랐으며 다음해에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외직에 있을 때 선정을 베풀어 명성이 자자하였으며 1541년(중종36)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제수받고 곧 형조참판으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명(明)나라에 갔다가 다음해에 귀국,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승차 하였다. 1543년(중종38)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과 공조판서(工曹判書)등을 거쳐 이듬해 우참찬(右參贊)이 되고 15456년(인종1)에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하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또 공조판서로 옮기고 그 해 8월 인종(仁宗)이 승하(昇遐)하고 명종(明宗)이 즉위하자 호조판서로 전임되었고 이어 대사헌이 되었다. 이때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윤원형,이기(李기),임백령,정순봉,공 등 몇몇 신하에게 대윤(大尹)인 윤임(尹任) 일파의 음모를 제거하라는 밀지(密旨)를 내렸는데 양사(兩司)는 그들의 심복이 많아 따르지 않으므로 이기가 직접 임금께 아뢰어 윤임, 유인숙(柳仁淑),유관(柳灌)등이 모두 사사(賜死)되었다. 이로써 공에게도 추성협익병기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炳幾靖難衛社功臣) 1등으로 양천군(陽川君)에 봉해지고 그 이듬해에는 숭록대부 의정부 좌찬성(崇綠大夫議政府左贊成)에 올랐다. 그러나 옥사(獄事)의 처리에 있어 이기가 독단으로 죄상이 뚜렷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에게까지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데 대해 적극 반대하였고 논공행상이 있자 공은 스스로가 공이 없음을 일곱차례나 상소한 끝에 윤허받고 나누어준 노비까지 모두 돌려 보냈다. 이일을 임금이 자못 불쾌하게 여겨 판중추(判中樞)로 좌천된지 4년동안 다시 임용되지 않아 서호(西湖)의 이의정(二憂亭)으로 물러가 때를 기다렸는데 1549년(명종4)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때 좌상(左相)이던 민제인(閔齊仁)이 당역(黨逆)의 죄로 공주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 아우인 제영(齊英)이 공론에 따라 당진(唐津)의 수령(守令)으로 임명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기가 심복인 대간 진복창(臺諫 陳復昌)으로 하여금 공 및 민제인,송순(宋純) 등이 은밀하게 죄역(罪逆)을 옹호하였다는 죄목(罪目)을 만들어 탄핵하자 공은 홍원(洪原)으로 부처되었고 양사가 삭탈관작(削奪官爵)할 것을 수차례 상소 하였으나 임금은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1551년(명종6)에 적소에서 운명하니 임금이 예관을 보내 치제하고 홍문관에서 무죄를 상주하니 관작을 복구 시키고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綠大夫議政府領議政)에 추증하였다. 공은 학문과 덕망(德望)이 높으시고 행실이 청간하였으며 국가가 흉흉하고 처사가 잘못되었을 때 항상 임금옆에 있으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충언 하였으므로 조정(朝庭)에서는 공을 크게 의지 하였다. 또한 일호의 뇌물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때 공정 무사하여 청백을 보전하고 평생 의를 지키시니 공의 사망을 듣고 모두 슬퍼하였다. 퇴계 이황(退溪李滉)은 공이 타인의 모함을 받아 홍원으로 귀양가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遠壑依依雲冪冪(원학의의운멱멱) 먼 골짝 아련한데 구름이 덮여 있고 輕風拂拂雨紛紛(경풍불불우분분) 한들바람 살랑이는데 비는 분분히 내리네. 窓前水石含幽憤(창전수석함유분) 창앞의 물과 돌도 울분을 머금으니 增我平生苦憶君(증아평생고억군) 내 평소 군을 그리워하는 마음 더하누나. 묘는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은거당 선영에 있고 묘 아래쪽 길가에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신도비문은 증손인 미수 허목이 찬했다. 문집은 동애유고(東厓遺稿)가 전한다. *사가독서(賜暇讀書) : 조선시대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한 제도. *사사(賜死) : 임금이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사약(死藥)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던 일. *신도비(神道碑) :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우던 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