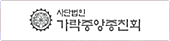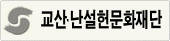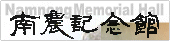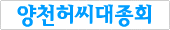|
|
|
||
| ㆍ분류 : 조선 | ||
| ㆍ별칭/관직명 : 대사헌 | ||
| ㆍ세수(世數) : 20 | ||
| ㆍ시호(諡號) : 문간(文簡) | ||
| ㆍ 청백리 : 선조조 | ||
| ㆍ호당(湖堂) : 신광한 | ||
| ㆍ문장/서화 : | ||
|
청백리(선조조) / 시호는 문간(文簡) / 호당(신광한 선) / 문장가  1517년(중종 12)~1580년(선조 13) 때의 인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시조로부터 20세손이다. 자는 대휘(大輝)이고 호는 초당(草堂)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아버지는 군자감 부봉사(軍資監副奉事)를 지낸 한(澣)이고, 어머니는 정부인(貞夫人) 창녕성씨(昌寧成氏)이며 둘째 아들이다. 초당공은 청주한씨 부인에게 2녀 1남을 두었는데, 장녀는 박순원에게 차녀는 우성전에게 시집을 갔고, 장남이 이조판서를 역임한 허성이다. 초당공은 한씨 부인과 사별후 강릉 사천 애일당 김광철(가선대부 예조참판)의 둘째 따님과 재혼하여 2남1녀를 두었는데, 허봉,허초희,허균이다. 초당 허엽을 비롯하여 그 분의 네 자녀(허성, 허봉, 허초희, 허균)를 합하여 세인들은 "허씨5문장가"라 칭해왔다. 1540년(중종35)에 진사에 뽑히고 1546년(명종1)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갑과(甲科)로 급제하고 1551년(명종6)에 부교리를 거쳐 1553년(명종8)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뒤이어 장령을 지내고 필선(弼善)과 다음해 대사성(大司成)을 지냈고 1562년(명종17) 지제교를 지낼 때 박계현(朴啓賢)과 함께 왕의 명을 받고 옥취정(玉翠亭)에 들어가 율시(律詩)로 화답하였다. 이해 동부승지로 참찬관(參贊官)이 되어 경연에 참석하여 윤근수(尹根壽),조광조(趙光祖)의 신원을 청하고 허자(許磁), 구수담(具壽聃)의 무죄를 논한 사건으로 파직되기도 하였다. 다시 삼척부사(三陟府使)에 복직되었다가 파직되었고 1568년(선조1)에 진하부사(進賀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대사헌(大司憲)에 올라 향약(鄕約)의 실행을 건의하였고 1575년(선조8)에 동인(東人),서인(西人)의 당쟁이 시작될때 김효원(金孝元)과 함께 동인의 영수(領袖)가 되었으며 부제학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 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대사헌(大司憲)에 전임되었다. 공은 서경덕(徐敬德)에게 학문을 배우고 노수신(盧守愼)과 벗하였으며 동인의 영도자로 벼슬을 30년 지냈으나 생활이 검소하였다. 일찌기 경상도 관찰사로 김정국(金正國)이 찬수한 [경민편(警民編)]을 보충하여 반포하고 [삼강이륜행실(三綱二倫行實)]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고 개성의 화곡서원(花谷書院)에 제향(祭享) 되었다. 저서로는 [초당집(草堂集)]이 있다.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 지은 신도비(神道碑)에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은 기상(氣像)과 도량(度量)이 일찍 이루어져 7~8세 때에 효도와 공경이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났다. 일찌기 말씀하기를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이후로 학문이 밝아 지지 않은것은 아니나 그 성취한 것이 도리어 한(漢).당(唐)만 못한 것은 어찌 스스로 터득함과 남의 말을 얻어 들음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고는 나공식(羅公湜)에게 질문 하였다. 공은 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이 인종(仁宗)에게 [심경부주(心經附註)]를 강하도록 권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심경부주]를 찾아 읽고 황홀하게 학문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이여(李畬) 선생에게 학문을 닦고 뒤에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에게 사사(師事) 하였다. 태학(太學:성균관)을 아홉번 맡았는데 개연(慨然)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자임하여 선(善)을 붙들고 악(惡)을 막았으며 폐지되고 실추된 것들을 이르켰다. [대학(大學)],[중용(中庸)]과[근사록(近思錄)]을 통독하고 [예기(禮記)]의 [유행편(儒行編)]을 써서 서재(書齋)의 벽에 붙여 놓았으며 사학(四學)을 두루 벼슬하기를 국학(國學)에서와 같이 하였다. 기묘년(1579년 선조12) 영남 관찰사(嶺南觀察使)가 결원이 되자 성상(聖上)은 삼공(三公)에게 인물을 천거하도록 명령한 결과 공을 발탁하였다.공은 교화를 우선으로 여겨[경민편(警民編)]과 [삼강행실(三綱行實)][오륜행실(五倫行實)] 수천권을 인쇄하여 배포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 문묘(文廟)를 뵙고 여러 생도(生徒)들에게 숙식을 후하게 대접하였으며 학문하는 방법을 써서 보였다. 공이 별세하자 국학(國學)과 서원(書院)의 유생(儒生)들이 모두와서 제물(祭物)을 올렸으니 덕(德)을 높이고 도(道)를 즐거워 하는 기풍은 속일 수가 없었다. 공은 일찌기 입시(入侍)하여 밤에 군주를 뵙고는 "조광조(趙光祖)가 군주와 백성들을 요(堯).순(舜)으로 만들려 하였는데 참혹한 화를 당하였으니 속히 신원(伸寃)하여 인심을 바로 잡을 것" 을 청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이언적(李彦迪)의 책을 거두어 모아놓고 읽어보시면 이또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황(李滉)과 이항(李恒),조식(曺植)에게 공경을 지극히 하고 예를 다하여 정성으로 초정하시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송(宋)나라에 태어났으나 등용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천고에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중호(李仲虎)와 장륜(張崙)은 학행(學行)으로 세상에 이름났으며 박형(朴泂)은 [소학(小學)]을 가르쳐 문도(門徒)가 수백명에 이르오니 청컨대 이들에게 녹봉을 주소서" 하니 임금은 이 말을 따랐다. 공은 처음 문장학(文章學)을 공부하였으나 뒤에는 이것을 모두 버리고 현자(賢者)를 높이고 선비들을 사랑하였으며 종성령(鐘城令)과 동문수학하였는데 강론을 단 하루도 거런적이 없었으며 30년 동안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문과 뜻이 선비로 있을 때와 똑같았다. 남파(南坡) 홍우원(洪宇遠)이 당시의 정승에게 준 편지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외증조(外曾祖:許曄을 가르킴)에 대한 시호를 내리는 일은 실로 국가의 은총입니다. 행장(行狀)은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지었고 묘갈명(墓喝銘)은 우복(愚伏) 정경세(鄭經세)가 지은 것인데 모두 유현(儒賢)의 믿을 수 있는 글이니 굳이 시장(諡狀)을 다시 찬한 뒤에 상고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증조께서는 관직에 있을 때에 퇴계(退溪) 선생에 대한 시호를 내리는 일을 맨먼저 경연(經筵)에서 말씀하셨는데 "문인(文人)인 조목(趙穆)이 퇴계의 언행(言行)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굳이 다시 시장을 만들것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선조(宣祖)께서는 특별히 윤허를 내리셨으니 이는 선왕조에서 이미 행한 규정입니다. 또 정경(正卿:판서)을 추증(追贈)한 것은 성상의 결단에서 나왔으니 성상의 은혜가 망극하오나 남쪽 지방의 사론(士論)들은 자못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기며 미수(眉叟:許穆의 호) 또한 부족한것으로 여겨 높은 품계(品階)로 올릴 것을 아뢰고자 한다 하옵니다" 이상은 [남파집(南坡集)]에 보인다. 수암(守菴) 박지화(朴枝華)는 말하기를 "우리 도학(道學)이 의탁할 곳이 있어 나라가 흥왕할 길조이니, 조정이 비로서 의지하여 중해졌다" 하였고 간이(簡易) 최립(崔립)은 말하기를 "선생은 자신을 새롭게 하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학문으로써 성상께 아뢰어 성상의 공부를 도왔다." 하였으며 상촌(象村) 신흠(申欽)은 말하기를 "허초당(許草堂)이 종신토록 선행을 하였다" 하였고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은 말하기를 "초당은 화담(花潭)의 높은 제자이니 서원(書院) 배향(配享)에 그 분을 빼는 것은 미안한 바 뒤에 비난이 있을까 두렵다" 하였는 바 이는 모두 본집(本集)에 보인다. 문장가 / 노수신,서경덕에게 학문을 전수받고 문장에 능했으며 회재 이언적의 옥산서원 현판을 썼고 초당집(草堂集)이 있다.  20세 허엽 묘역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2리 산 61 19世 봉사 허한(奉事 許僩), 아들 20世 구(昫),엽(曄), 손(孫) 21世 기(芑),성(筬),봉(篈),균(筠), 증손(曾孫) 22世 주(宙),실(실),보(보)의 묘를 1969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고속도로 개설로 이곳으로 옮겼다. *사가독서(賜暇讀書) : 조선시대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한 제도 *청백리(淸白吏) : 조선 시대에, 의정부·육조 및 경조의 2품 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우두머리가 천거하여 의정부에서 뽑았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