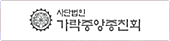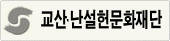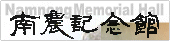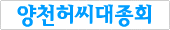|
|
||
| ㆍ분류 : 경상 | ||
 이택당은 30세 성재 허전(性齋 許傳)을 모신 사당이다. 허전 선생의 자는 이노, 호는 성재.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정언 허형(許珩)의 아들이다. 1797년에 포천현 본동에서 출생하여 1886년에 별세하였다. 기호 남인제의 학풍을 계승한 학문과 예학의 대가이다. 저서에 문집 38권 외에 이상적 군주상을 그린 [종요목]과 [철명]편이 있으며 사의(士儀)는 오백년 조선예학의 결산이라 평가한다. 매년 3월3일 사우에서 석채례를 봉행한다. * 위치 : 경남 산청군 신등면 법물리 * 이택당內에 물산영당 있음 이택, 여택(麗澤) 麗, 고을 려(여)자이다. 한자사전에 보면 '이'라는 독음은 없다. 그래서 麗澤은 '여택'으로 읽어야 겠지만 '이택'으로도 읽는다. 굳이 구분하자면 여택으로 읽으면 고운 연못이란 뜻이고 이택으로 읽으면 이어져 짝을 이룬 두 개의 연못이란 뜻이다. 두 개의 잇닿은 연못은 '주역'에 그 연원이 있다. 태괘(兌卦)의 풀이는 이렇다. "두 개의 못이 잇닿은 것이 태(兌)다. 군자가 이것을 보고 붕우와 더불어 강습한다." 무슨 말인가? 두 연못이 이어져 있으면 서로 물을 대주어 어느 한 쪽만 마르는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붕우는 늘 서로 절차탁마하여 상대에게 자극과 각성을 주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서로 이어진 두 개의 못이 이택(麗澤)이다. 이때 이(麗)는 '붙어있다' 또는 '짝'이란 의미다. 고려시대 국학(國學)에 이택관(麗澤館)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이택당(麗澤堂)이니 이택계(麗澤契)니 하는 명칭이 여럿 보인다. 《이상은 정민 교수(한양대·고전문학)의 "[정민의 세설신어] [53] 이택(麗澤)"에서 발췌》 검색 편의를 위하여 이택과 여택을 병기(倂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