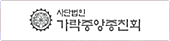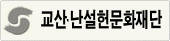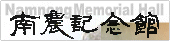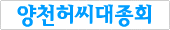|
|
||
| ㆍ분류 : 강원 | ||
 앙간비금도(仰看飛禽圖) 22.2x12.0cm 종이에 채색 허엽의 12대 종손 소장 뜰 밖에 지팡이를 든 아버지로 보이는 인물과 손을 잡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흥미를 주는데, 멀리 원산이 둥글게 표현된 점이나 얼굴을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보는 소녀의 표현에서 허난설헌(許蘭雪軒)이 유년기에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륵법으로 그려진 나무와 모정(茅亭)으로 보이는 건물의 선들은 각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사실감을 주고 있다. 단, 모옥 앞의 토파와 강이 만나는 경계선의 처리에서 수초를 토파에 자라는 풀처럼 그려 넣어 마치 강물이 토파 위에 있는 듯한 어색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 작품은 산의 처리에서 보이는 천진함과 전경의 키 큰 나무와 모옥의 사실감 등이 돋보여 당대의 화보 풍의 산수화에서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이 살아있어 주변의 실경 맛을 느끼게 해준다. 어려서부터 '여신동'으로 불리던 허난설헌의 "앙간비금도"는 '여성적 자아'가 투영된 초초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부녀로 보이는 두인물이 뜰에 서 있다. 어린 딸은 머리를 젖혀 저 멀리 산 위로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데, 그 소녀야말로 허난설헌의 또다른 자아라고 미술사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허난설헌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린 앙간비금도를 보자. 아버지와 딸이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고 있다. 조선시대 문인화에 있어서, 여자가 그림에 등장하는 예는 극히 희귀하다 한다. 이 난설헌의 그림은 아마도 최초로 사내아이가 아닌 여자 아이가 그림에 등장한 그림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자들은 저 창공을 자유로이 나는 새들을 보고 있는 여자 아이가 난설헌 자신을 형상화한 것이라 추측한다. 조선 중기까지 우리의 그림은 대부분 화보풍의 산수를 그린데 비해 난설헌의 이 앙간비금도에는 주변의 실경이 등장하고 있어, 조선후기에야 나타난 진경산수화나 풍속화보다 오히려 선구적인 면이 있다. 문인화에 남자가 아닌 여자아이를 넣은 획기적 사항은 그렇다 치고, 그림 옆에 써진 난설헌의 글씨에 주목해보자. 사람들은 저 글씨체가 여자의 글씨체가 아니라 남성의 글씨처럼 힘이있고 대범함이 엿보인다 한다. 우선은 칭찬인듯한데, 만약 난설헌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듯하다. 난설헌이 살며 괴로웠던 이유는 바로 신분의 차별, 재능에 펼치는데 있어서 남녀의 차별에 있었다. 난설헌의 글씨는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난설헌만의 개성있는 글씨다. 난설헌이 글씨를 배운 것은 그의 아버지 허집, 그의 오빠인 허봉, 그리고 큰 오라비의 친구이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달에게서였다. 당연히 교육을 담당한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만약 난설헌이 '여성적'이란 표현에 액자맞춰진 교육환경에서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교육되었다면 그녀의 글씨체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는 남녀의 역할적 구분이나 학문적 재능이 선천적으로 생태학적인 면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성의 글씨 = 힘있음, 대범함) : (여성의 글씨 = 부드러움, 섬세함)]이란 공식은 단지 가부장적 사회가 남녀 구분해서 제공한 교육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다. 난설헌이 죽은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저 공식에 얽매여 난설헌의 글씨를 평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의 헤게모니가 가부장적 사회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